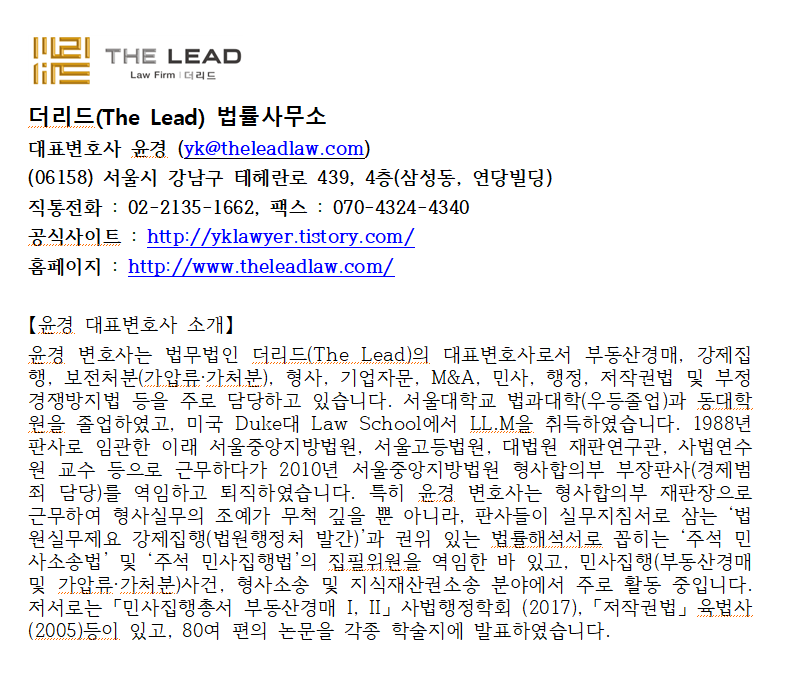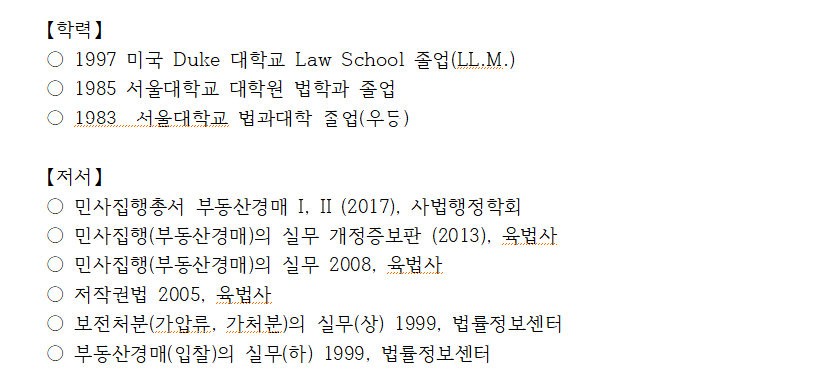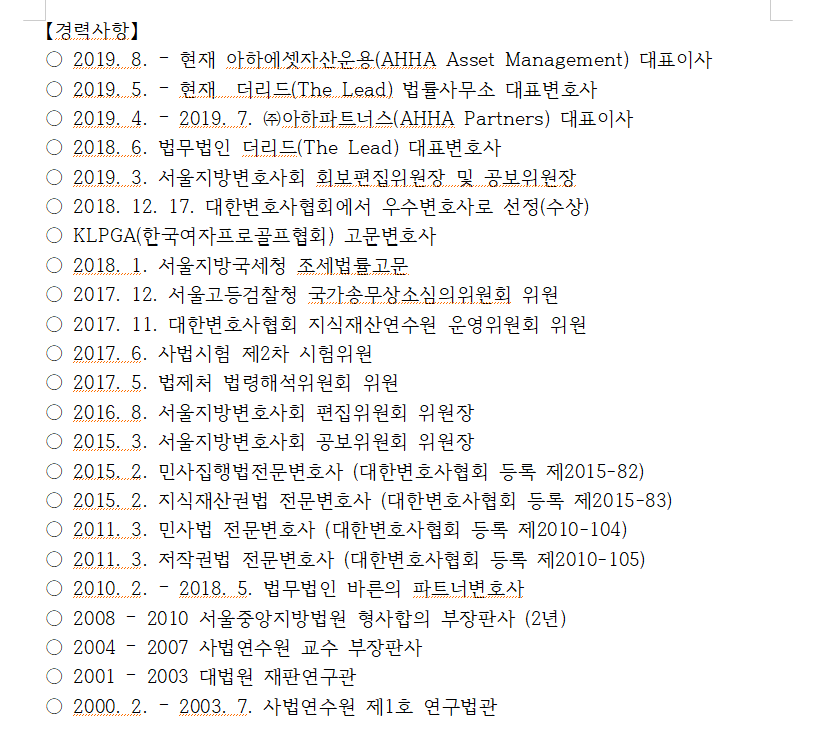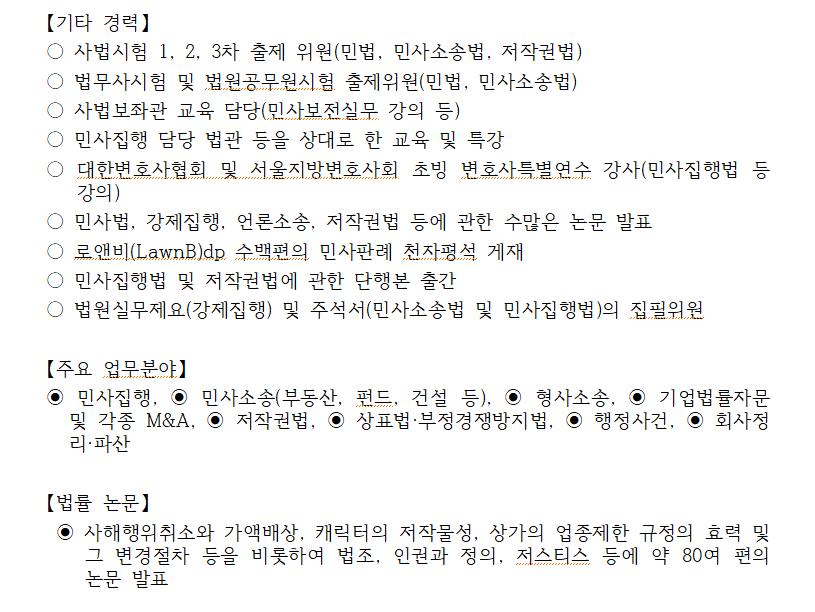【선하증권, 해상운송인의 단기제척기간】《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송하인 대신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및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아간 자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373-377 참조]
가. 선하증권의 의의 및 효력
⑴ 선하증권의 의의
㈎ 선하증권은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임
㈏ 해상운송은 통상 운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운송 중인 화물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이용하게 됨
⑵ 선하증권의 효력
㈎ 채권적 효력 :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 물권적 효력 :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고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나.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일반론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lawful holder)’이 위와 같은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①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②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송하인은 선하증권의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됨. 송하인이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 다시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할 수 있고, 이처럼 선하증권을 연쇄적으로 양수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이 됨
㈏ 대법원 판례는,
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임은 ㉠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증명하거나, ㉡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②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있다고 함(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⑵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송하인’란에 “PT. ENERGI SUMBER ALAM(= ESA) ON BEHALF OF KP CO., LTD.(= 피고보조참가인)”라고 기재되어 있음. ⇒ 송하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고 ESA가 그를 ‘on behalf of’한다는 의미임
① 참고로, (선하증권 문제는 아니나) 대법원 선례 중 ‘on behalf of’를 ㉠ “~를 대신하여”로 번역한 경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와 ㉡ “~를 대리하여”로 번역한 경우(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가 있음
② 실무상으로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on behalf of’가 대리를 의미하기도 하나, 반드시 대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여러 법률관계에 사용되고 있다고 함
㈏ ‘on behalf of’를 어떻게 해석하든 일응 ESA가 송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은 인정됨에 의문이 없음.
이때 ESA가 단순히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임
㈐ 외국에서는 ‘선하증권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는 정당한 소지인(lawful holder)으로 취급되어 (물리적으로만 이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한 소지권한을 가진 것으로 설명된다고는 하나, 이 부분 대법원 선례나 국내 학설은 찾기 어려움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의 태도
㈎ 위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 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그를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보았음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7006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등 참조),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위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은, 선하증권상 ‘on behalf of’라는 문언에 따른 제한을 받더라도 송하인을 대신하여 선하증권을 수령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여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임
⑷ 위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사안의 경우
㈎ 원심은 ‘ESA는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선하증권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선하증권의 문언에 송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것이므로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위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음
㈏ ESA는 이 사건 석탄을 송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대신 수령한 것임. 이 때문에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ESA on behalf of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기재․발행한 것임
㈐ 따라서 ESA가 단순히 송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선하증권을 수령하는 권한만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위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SA가 선하증권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나아가 그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원고 역시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함
다.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무단반출한 경우 무단반출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⑴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임
☞ 참고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렵게 되기만 하였으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 에게 이전됨(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⑵ 위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운송인과의 공동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인뿐만 아니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받아간 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 한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⑶ 원심은 ‘송하인으로부터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석탄을 인도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운송인으로부터 석탄을 인도받아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위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음
라. 위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은 선하증권에 ‘on behalf of’라고 기재되어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하였음
마. 송하인 대신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및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②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아간 자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⑶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등 참조),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⑷ 송하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송하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담보 목적으로 또다시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이 사건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그와의 상환으로 위 운송물품을 인도받아가야 함에도 무단으로 석탄을 인도받아갔다.
이에 원고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⑸ 대법원은, ① 선하증권의 문언에 송하인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자로서 송하인에게 이 사건 석탄을 매도한 거래상대방인 인도네시아 법인(ESA)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② 위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원고(=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석탄매도인) 또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고, ③ 송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위 각 석탄을 인도받아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선하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1-2.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고홍석 P.745-748 참조]
가.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 발생 배경(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⑴ 국제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은 화물에 관하여 발행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운송의무를 다하게 됨
통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시식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지정되고, 수입업자는 통지처로 표시됨
⑵ 그런데 국제화물운송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는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그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보세창고업자가 수입 화물을 보관하고 있어도 아직 운송물의 인도가 완료된 것이 아님
☞ 따라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는 계속 존재함. 보세 장치장에 있던 화물이 불법반출되면 운송인이 인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⑶ 문제는 관세법상 수입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경우, 창고에 대한 배정권은 실수입자가가 진다는 점(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있음. 즉, 무역실무상 운송인이 아닌 실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송인에게 화물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입고하도록 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실수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아 장치함
⑷ ㈎ 이처럼 실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사용료도 지급하며 이들 양자는 통상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실수입자의 지배하에 놓임. 이때 실수입자가 화물인도지시서가 없어도 세관에서 화물을 인도해 주는 사정을 이용하여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자신과 임치계약관계에 있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요청하여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징구하지 않고 그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가 발생함
㈏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하며 발행하는 증권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운송물을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하고, 보세창고업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회수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임
⑸ 그런데 이때 대체로 실수입자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아직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⑹ 만약 불법반출되었더라도 신용장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신용장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면 뒤늦게 화물이 반출․멸실된 것을 알게 된 신용장 개설은행이 원고가 되어 운송인, 보세창고업자, 실수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됨
운송물불법인도사고에서 통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원고가 됨
나. 보세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근거
⑴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그에 표창된 화물을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의문이 없음
⑵ 문제는 자신과 임치계약을 체결한 실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반출해 주었던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무엇인지에 있음
⑶ 대법원 판례는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비록 보세창고업자와 실수입자 사이에 임치계약이 있더라도 이와 별도로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또 다른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른바 ‘이중임치이론’을 취하고 있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등), 위 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음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08649 판결 :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⑷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운송인과 묵시적 임치계약을 체결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
⑸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대법 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등)
다.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내용 및 대상범위(새로운 판시)
⑴ 위 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은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판시를 하였음. 즉 보세창고업자는 ① 화물인도지시서의 적법 발행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② 보세창고업자는 화물인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08649 판결 :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위 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은,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라. 위 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사안의 경우
⑴ 피고는 운송인과 묵시적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
⑵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이는 설령 피고가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마.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②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이다.
⑵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⑶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⑷ 수입업자는 원고가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원고에게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19. 선적되어 같은 달 24일 피고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
⑸ 피고는 운송회사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 5. 19.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고, 원고는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 6. 18.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다.
⑹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⑺ 원심은, 수입업자가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⑻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운송회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며, 피고는 운송회사와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원고와는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해상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규정 및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임정윤 P.373-402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04-2210 참조]
가.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
⑴ 199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해상물건운송인에 관하여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그 책임의 소멸기간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고 있었다. 1991년 개정 상법에서 헤이그규칙( 1924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1년의 단기 제척기간으로 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재판상의 청구를 요건으로 가중하고 기산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2007년 개정 상법은 1991년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제814조 제2항, 제3항에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대한 특칙 규정을 추가로 두었다.
●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②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⑵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르면 제소기간 경과로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한다.
또 위 조항은 문언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해상운송인의 송하인ㆍ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제소기간
⑴ 관련규정
●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상법은 해상운송인과 송하인ㆍ수하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에 관한 다른 판례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② [본문] 해상운송인과 송하인ㆍ수하인 사이의 채권은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되어야 한다.
단순한 권리행사기간이 아니라, 문언에서 ‘재판상 청구’라 하여 제소기간임을 명시하였다.
문언은 ‘운송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상’편에 있는 규정이므로, 해상운송인을 의미한다.
육상운송에는 제소기간 규정 자체가 없다.
③ 해상운송의 특성상 분쟁의 해결에 조속한 소제기가 불가피하므로, 상법은 단기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
해상운송은 대륙 간 운송으로서, 운송거리가 멀고 운송기간이 길며 관계자들이 다수이고 다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천적으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다각적이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
④ [단서]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은 이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제소기간에 관한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보아 ‘시효이익 포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다.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
이에 대하여는 ①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긍정설 과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부정설이 대립한다.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라.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3-44 참조]
⑴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인 경우
민법에는 점유회수청구권,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상법에는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상법 814조 1항)가 있다.
●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⑵ 보세창고
①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이전되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을 장치(藏置)하기 위한 보세구역(관세법 183조)이다.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保稅倉庫)는 세관에 대하여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여기에 보관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 ·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는 특전이 있다.
이 제도는 물품을 보세상태로 장기간 장치·보관함으로써 무역상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상기(商機)파악의 편의를 줌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 등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항구에 물건이 들어오면 통관절차, 세금 납부, 위생검사,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사를 받기 전까지 물건을 보세창고에 넣어놓고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쳐야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③ 보세창고에서 통관을 거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업무를 운송인이 하는 것이 관행인데, 만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통관절차를 수입업자가 하기로 했다면, 그때는 보세창고에 넣은 것을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점유자인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권을 수입업자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법상 인도의 방법에는 직접 인도, 간이인도(188조 2항), 점유개정(189조), 반환청구권의 양도(190조)가 있다.
관행상으로는 위와 같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대부분의 경우 보세창고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는 인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⑶ 해상운송인의 청구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① 해상운송인의 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이다.
② 제척기간의 취지는 권리 불행사에 따른 제재이므로, 권리 불행사가 되려면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사안의 경우, 터키 항구로 들어간 이후 甲과 乙이 계속 양해를 하면서 인도시기를 묵시적으로 늦추고 있었던 상황이다.
통관이 곧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연락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한 것이다.
③ 그렇다면 터키 항구에 도착했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기간 동안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고, ‘포기한 날’이 ‘인도를 못하게 된 날’이므로 그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서 가장 공정할 것이다.
④ 당사자 사이에 양해를 계속해 오다가 더 이상 양해를 하지 않게 된 날이 바로 “인도할 날”이다.
그 날부터 기산하면 1년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바뀔 것인지 여부도 고려하여 파기하였다.
마.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이다.
⑵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참조).
⑶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운송계약상 목적지인 터키 내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당초 해당 화물은 터키 내 항구를 경유하여 시리아까지 운송될 예정이었는데, 터키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터키 내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임치되어 있었고 결국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한 사안으로, 해당 화물이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화물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될 수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883-2888 참조]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
⑴ 관련 규정
●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단서 생략)
⑵ 위 규정의 취지
㈎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등).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 또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 중 “인도할 날”의 의미는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라고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등).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채권 및 채무의 ‘청구원인’이 운송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등).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은 이상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
⑴ 종래 하급심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도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았다(부산고등법원 2016. 1. 23. 선고 2015나5289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67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048357 판결).
⑵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송인의 채권’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그 제척기간은 1년이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⑴ 문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어 그 제척기간을 1년이라고 볼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있다.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운송계약상 약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정해진 요율에 따라 매일 발생하는 채권이다. 위 대상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도 “호찌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찌민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원고와 피고가 호찌민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인도할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게 되면 ‘인도할 날’부터 이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도한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⑵ 이러한 경우에도 제척기간 기산점을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문언대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급심 실무례는 대체로 그러한 경우에도 그 기산점을 ‘인도한 날’로 보아 그로부터 1년의 경과한 후에 제척기간이 도과한다고 보았다[부산고등법원 2016. 1. 23. 선고 2015나52893 판결(심불기각),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6700 판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048357 판결(심불기각)].
그 근거로는, ① 위 제척기간은 운송인과 송하인․수하인 사이의 채권․채무를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 안에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명문으로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할 뿐 소멸대상 채권의 발생 시기를 제한하고 않는 점, ③ 해상운송은 관련 당사자가 다수이고 다국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이를 단기간에 확정지을 필요성이 큰 점, ④ 운송인은 장래 이행의 소 등의 방법으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⑶ 그러나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은, 하급심 실무례와 달리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가)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호찌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찌민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호찌민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민법 제166조 제1항)인 것과 달리,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가 있으므로,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민법 규정 중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 중에도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정한 경우(민법 제406조 제2항, 제572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 등)도 있음]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예를 들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의 발생일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약정기간 도과 후 수령지체 시 매일 발생하고 수령지체가 계속되는 한 1년이 경과하여도 계속 발생함. 그런데 기산점을 ‘인도할 날’로 보게 되면 ‘인도할 날’ 이후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된다.
특히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결국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은 “인도할 날”(=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① 제척기간 자체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이지만, ② 그 기산점은 그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인도할 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사안의 경우
⑴ 원심은, 호찌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산점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청구는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⑵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호찌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안에 발생한 부분까지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②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이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인데,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중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핵심쟁점이다.
⑵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등 참조).
⑶ ㈎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호치민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이 되어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는 불합리하고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구 관습법 또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⑷ 원고는 피고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을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호치민항까지 운송하였는데, 위 화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출하려한 폐기물이었고, 수하인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 등이 발생하자, 원고가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후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 1년 동안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등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약 2년 동안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청구 전부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