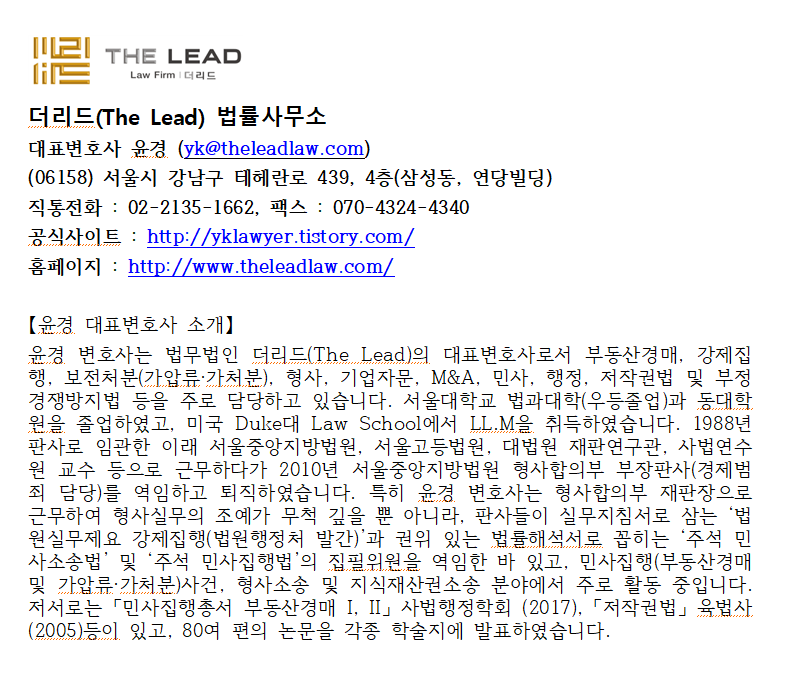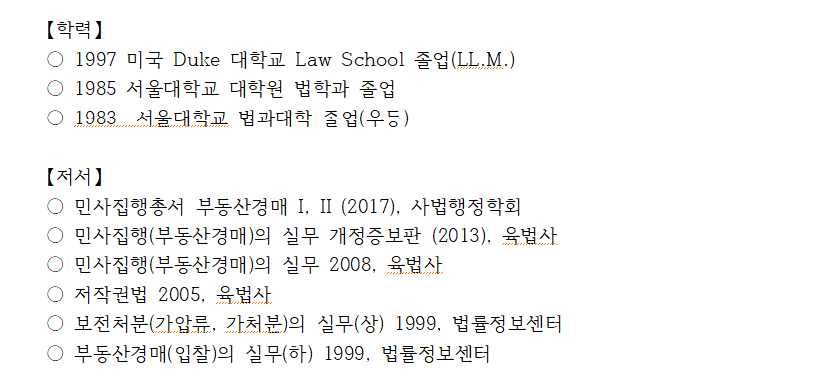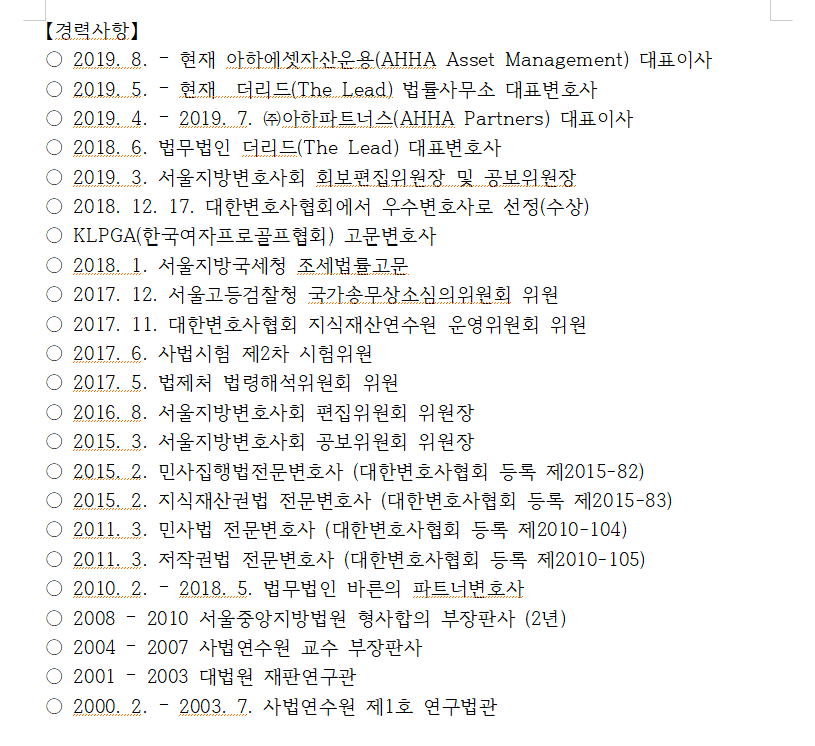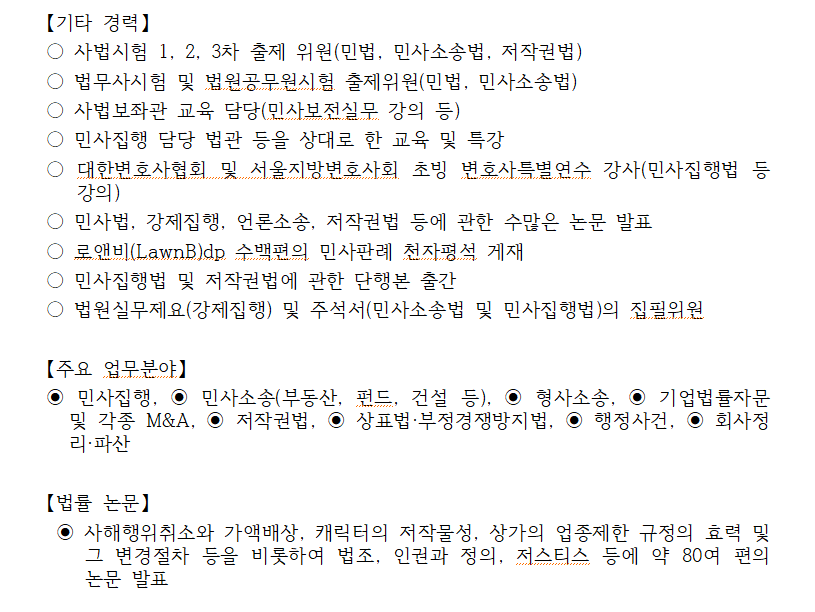【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장래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미리 청구할 필요,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682-685 참조]
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⑴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이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⑵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⑶ 또한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⑷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나. 아무런 실익이 없는 청구
⑴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전부멸실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비록 가등기 가처분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그대로 등재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가등기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399 판결).
⑵ 또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으므로, 그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될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⑶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소송계속 중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으로 말소된 때에는 그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도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다. 장래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
⑴ 미리 청구할 필요
① 장래이행의 소, 즉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민소 251조).
② 판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③ 선이행 조건부 청구도 장래이행 청구의 일종이므로 먼저 자기 의무를 이행하여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따위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 예컨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④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완제에 의한 소멸을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등기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심리결과 저당채무나 양도담보채무가 아직 일부 남아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판례는 설사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액 등을 다투면서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나머지 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선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⑤ 그 밖에 ‘미리 청구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될 것을 전제로 미리 자기에게 분할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또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아직 채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를 받은 다음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판결).
⑵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①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하에서 판례는 장래이행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져 형평에 반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신설하였다(민소 252조).
②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소 252조 2항). 이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218조 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라. 이행의 소의 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301 참조]
⑴ 소의 이익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란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본안의 심리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소의 이익은 대개 아래 3가지를 말한다.
㈎ 권리보호자격 : 법률적 쟁송이 아닌 것, 예컨대 호적에서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소는 권리보호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다.
㈏ 권리보호이익
㈐ 당사자적격 : 예컨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가 등기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다.
⑵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판례가 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가 발견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미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된다(동지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② 형식주주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원고들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다음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질주주는 회사를 상대로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하고, 형식주주를 상대로는 주주확인청구를 해야 하는데, 형식주주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각하된다.
③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적장부(등기부,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고, 이행청구의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공적 장부 기재를 변경할 수 없어 말 그대로 소송을 할 이익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본안심리까지 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에서 소 각하를 하는 것이다.
2.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685-686 참조]
①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② 따라서,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면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은 모두 이를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부적법하다.
가. 입찰절차상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⑴ 판시 사항
① 원고들이 응찰한 이 사건 입찰은 정부가 행사는 공사에 관한 국제입찰로서,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PQ)심사,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현장설명, 입찰집행,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적격심사서류 제출, 적격심사, 적격낙찰자 선정, 계약체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다른 7개 입찰참가업체와 함께 PQ심사를 통과하고, 그 후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여 두 번째로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였다. 그 후 조달청장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참가한 공동수급업체들에게 교부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조달청 시설공사계약관은 긴급공사입찰공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새로이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진행된 입찰절차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었고 그 입찰절차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로 낙찰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응함으로써 예약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입찰절차를 진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찰절차가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과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다.
②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할 경우 원고들은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 추후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과 이 사건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확인의 소로써 위험 · 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잡은 구체적 권리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 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⑵ 분석
① 원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는 구체적 권리로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적격심사에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받아 비로소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불확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본판결은 입찰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입찰특별유의서상 입찰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입찰절차의 계속성에 대한 입찰참가자들의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므로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원고들의 지위를 단순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으로 보았다.
② 본판결은 확인의 소로써 위험 · 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관계나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에 터잡은 구체적 권리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확인의 소의 대상의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그 후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 · 결정하면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비록 아직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예정통보 및 분양공고에 따른 택지분양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예정통보 및 분양공고상의 공급조건에 강행법규 위반의 점이 있어 분양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공급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전의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⑴ 판시 사항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전의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 만료시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 사립학교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⑵ 분석
① 본판결 이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이 그 기간 만료 전에 해촉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본판결에서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②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한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로 통설도 같은 입장이다.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본판결은 종래의 일관되고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본판결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 공익적 견지에서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로 도입된 것으로서 특히 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이외의 다른 민사분쟁의 해결수단, 행정적 · 입법적 구제의 유무나 민사사법권의 한계를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만큼 이를 확대 · 적용함에 있어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대법원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본판결이 소극설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것은 여전히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학설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그 확인의 이익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판례도 점진적으로 소의 이익을 확대해 온 점에서 보면 본판결은 그러한 경향을 차단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와 같은 위험이나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위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③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 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이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가 업무정지처분기간중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한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기간 경과 후에도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후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에 의해 변경된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소의 이익을 확대하여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가능한 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종교단체의 징계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⑴ 판시 사항
① 피고 교회가 목사, 장로의 신임투표 실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시무장로였던 원고들이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임당하여 당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무임장로가 되자,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상대로 위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 교회는 본 안전 항변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동의회 결의의 실질은 교회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 내부의 권징 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원고의 사법상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대법원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본판결은 그 근거로서, ① 교회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고 보거나 소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법상 지위의 존부나 그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결 및 처분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에서조차도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큰 점, ② 현실적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 그와 관련하여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회의체의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수가 적지 아니할 터인데, 그저 종교단체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에 관한 심리조차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이 점이 바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를 통상의 권징재판과 구별하는 대목이니, 양자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통상의 권징재판이 그러한 처분의 ‘원인’ 내지 ‘이유’를 신앙 · 교리에서 찾고 있다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시무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는 반대로 그 ‘효과’ 면에서 피고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특히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제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를 바탕에 깔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한데다가 교단 분열로 인하여 소속 교단부터가 불분명한 경우, 처분이나 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노회 기타 상급 치리회를 확정할 수 없어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이 사건 2001. 12. 30.자 공동의회를 소집함에 있어 그전에 거쳐야 하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2001. 8. 5.자 당회에서 그 해 안으로 위임목사와 시무장로 전원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결의가 전원 일치로 이루어진 점, 그 신임투표의 실시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 4. 열린 당회에서 원고들은 같은 해 12. 30.에 신임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피고측 9명은 같은 해 11. 25.에 실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 실시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12. 16. 같은 안건을 놓고 다시 열린 당회에서는 원고들이 다시 입장을 바꾸어 같은 달 30일에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데 반대함으로써 연내에 실시하기로 만장일치의 결의가 이루어진 신임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역력히 내비친 점, 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는 2001. 12. 30.자 공동의회가 소집된 것은 결국 당초의 2001. 8. 5.자 당회 결의의 주된 취지에 부합되는 점, 목사와 시무장로들에 대한 위의 신임투표는, 원래 집사들이 세례교인 약 1,500명 중 951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실시를 당회에 청원한 것으로서 2001. 7. 2. 열린 제직회에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그 결과 개최된 2001. 12. 30.자 공동의회에서는 전체 세례교인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58명의 교인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개표 결과 원고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원고 A조차도 297표만을 얻는 데 지나지 않는 등 압도적인 표차로 불신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⑵ 분석
① 종래 대법원판례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더러,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② 본판결은 종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 등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문제인 경우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내의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나 처분이 그 자체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 사법적극주의의 입장에 서면서도, 그 결의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함에 있어 일반단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라. 종전이사가 제기한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식이사선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⑴ 판시 사항
① 피고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그가 설립한 상지대학교의 학내 소요사태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해 임시이사가 선임, 교체되어 약 10년간 임시이사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왔는데, 임시이사가 그 선임사유 종료시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종전이사)인 원고들이 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종전이사에게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②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경우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종전이사)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여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그 이유는,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 권한 중 후임이사 선임 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그 중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에 뒤이어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종전이사들은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본안의 쟁점인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었고, 그 후 헌법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바101 전원판부 결정은 본판결을 인용하며 학교이사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등 그 권한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⑵ 분석
① 본판결은 종전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본 논거들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립학교를 그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데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으나, 보충의견에 나타난 것처럼 확인의 이익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시이사들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결의라는 사실상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려 준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② 한편, 이 사건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이와 같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문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었다.
이 사건 소송 진행중에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제25조의3이 신설되어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초 · 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게 되었고(위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호, 2007헌마1190호 위헌확인사건이 현재 심리중이다), 다시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였고, 그리하여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게 되었다(위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헌바144호, 2010헌바101호 위헌소원사건이 현재 심리중이다).
이 사건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 8. 9.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관하여 옛 재단 쪽이 추천한 4명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천한 2명과 학교 구성원이 추천한 2명 등 정식이사 8명과 옛 재단 쪽 몫으로 할당된 정식이사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옛 재단 쪽이 합리적인 인사를 추천하면 추후 정식이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③ 한편, 이와 같이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에 위법이 있으면 관할청을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 6076 판결은 종전이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경기도교육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하자 종전이사가 다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임사이사들에 의해 선임된 정식이사들과 동일인을 다시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인 점 등을 들어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가 있은 후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⑴ 판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 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⑵ 분석
①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은 본판결에 의해 변경되었다.
② 본판결에 이어서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및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그리고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 ·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는데, 본판결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 고시가 있은 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소송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⑴ 판시 사항
①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병원 주차장을 임차하려고 한 피고 A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병원 영안실을 임차하려고 한 피고 B회사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위 서면들은 원고의 외사촌동생인 소외 C에 의해 무단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②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위 서면 중 ‘원고가 피고 A로부터 9억 원을 병원의 주차장 임대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 ‘원고가 피고 B로부터 4억 원을 병원의 영안실 임대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은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원고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정적으로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서면들을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피고들이 위와 같이 표현대리의 성립 주장을 하더라도 그 표현대리책임은 민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들이 원고에 의해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확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 A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 A와 관련된 원고명의의 위 서면들을 증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금의 지급 및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 지급 약정 등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금원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A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별소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하였다.
⑵ 분석
① 본판결은 영수증은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는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으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적격을 명확히 하였다.
② 종래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일 것을 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은 증서 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한다고 판시하며, 주택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조합의 일정한 시기의 영업재산상태를 밝힌 장부이거나, 영업재산의 손익관계를 밝힌 보고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합원입금일람표는 조합원이 일정한 금액을 조합에 불입하였다는 것을 기재, 확인하여 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 것이나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은 합의서 및 보관증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세금재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급하는 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판결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따라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은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③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앞서 본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은 A회사는 원고에게 선박을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선박을 계속 관리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선박을 A회사에게 반환하고 용선료도 모두 지급하였는데, A회사가 피고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공급자를 원고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위 세금계산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그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진부가 다투어질 수 없게 되는 결과로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 곧 원 ·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및 이에 따른 원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부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 · 피고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직접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진부 확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관계상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현재 선박의 용선을 둘러싸고 용선료 지급 등의 분쟁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세무관서에서 마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용선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의 진부에 관하여 원고는 단지 세무관서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을 뿐이고, 미리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가 위조되었다는 판결을 받아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세무관서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④ 한편,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합의서 및 보관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서면의 기재와 같이 성립된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위 서면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원인이 된 계약을 취소하고, 가사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서면 작성 이후에 새로운 합의를 하였으므로 종전의 합의서 및 보관증에 기한 권리의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건에서, 위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이에 의하여 원고주장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청구의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본판결이 피고들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원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문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확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확인의 이익을 좀 더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본판결은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 A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 A와 관련된 서면에 기하여 약정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고, 피고 B회사도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와 관련된 서면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는 목적은 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문서에 기한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문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또한, 피고들은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시에는 피고 B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계속중이었으므로 확인이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판결은 이 사건 소 제기시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으므로 그 후에 피고 B회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4.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의 본안심리 방법 [이하 사법 57호 이용우 P.673-718 참조]
가. 확인의 이익
⑴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⑵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 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⑶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참조판결인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과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⑴ 위 대법원 96누9829 판결에 의하자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 노조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수리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사용자인 회사가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이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를 들고 있는바, 대법원 96누9829 판결이 취한 결론과 같이 양 대척점에 놓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을진대, 하물며 복수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경쟁관계에 있을 뿐인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⑵ 그런데 이른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규범적 상황이 그전과 현격하게 달라지게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로 말미암아, 행정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던 근거 규정인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을 더는 적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아래 표와 같이 행정관청이 30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담고 있지만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 그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효라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전의 조문 :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후의 조문 :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
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주체성과 자주성을 처음부터 흠결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갖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제도 내지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하다.
5.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 긍정) [이하 사법 57호 이용우 P.673-718 참조]
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립무효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실무이다.
⑵ 먼저 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은 법인이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노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적용된다), 현행 민법 등에는 법인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 관한 규정이 전무함에도(반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해서는 상법 제3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법적 성격은 ‘형성의 소’이다) 대법원은 법인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됨을 기본 전제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적이 있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1다29064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임야를 출연하고 소외인 등과 합의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정관을 작성, 그에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피고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위 소외인이 설립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그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 중인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⑶ 대법원판결 이유 중에 법인설립무효를 구하는 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보다 뚜렷하게 담은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사 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재단법인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⑷ 현행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법상 법인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상업등기법 제77조가 준용되고, 상업등기법 제77조는 그 제2호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서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관련하여 법원행정처가 2018년에 발간한 ‘민법법인등기실무’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법원행정처, 민법법인등기실무(2018), 262.].
먼저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가 무효가 되는 원인은, ① 등기사항의 기재에 문제가 있는 경우(형식에 의한 무효)와 ② 등기사항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실질적 무효)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후자에 따른 설립등기의 실질적 무효는 설립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립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러한 설립등기의 실질적 무효는 법인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56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업등기법 제77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를 등기말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는 괄호 부분에서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더라도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법인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무효·취소를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하에서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민법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위 괄호 부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에 따라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사유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무효의 원인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 등기사항이 일정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판결등본이 위 첨부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법인 이사의 사임등기가 마쳐졌지만 그 이사와 법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에 의하여 해당 이사가 이사의 지위에 있고 그 사임이 무효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이러한 판결등본은 이사의 사임 무효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⑸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의 소가 형성의 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주로 내세웠다. 즉 이 사건 소는, 피고 노조가 설립됨에 따른 그 이후의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형성의 소는 이른바 ‘형성의 소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 중 어디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를 간주규정으로 보는 한,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전항변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흠결함에 따라 더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게 되는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지,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를 간주규정이 아닌 해석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임을 표방하는 단체가 주체성과 자주성을 흠결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은 당연 무효라는 결론에 마찬가지로 이를 수 있다.
관련하여 어느 행정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들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항고소송은 ‘형성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으로 분류되고 그 인용판결 역시 ‘확인판결’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를 형성적인 것이 아니라 확인적 성격의 것으로 보면 족할 것이다. 확인의 소로 보면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긴다고 새기는 한, 아무런 논리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 반드시 ‘형성의 소’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의 내용 분석 (=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하 사법 57호 이용우 P.673-718 참조]
가. 복수노조 관련 규정
⑴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설립금지 규정이 폐지되었다.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 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⑵ 위와 같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자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서 기존 노조의 활동을 저지하고자 이른바 어용노조인 피고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였다.
나. 확인의 소
⑴ 복수노조의 경우에 교섭대표자만이 교섭 권한(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이 있어 복수노조 사이에 교섭대표자가 되 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노동조합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⑵ 설립무효확인을 청구하 는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피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조 활동을 하기보다는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변론종결시까지도 그와 같은 실질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이다.
다. 피고 노조가 주체성과 자주성을 흠결되어 그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
⑴ 위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의 원심은 피고 노조의 설립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였다. 나아가 유성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근로자가 피고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등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피고 노조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인 유성기업의 적극적인 기획·실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설립된 피고 노조는 그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지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⑵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실질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다시 구분된다. 전자의 적극적 요건 중 주체상의 요건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따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구성원 중 거의 모두가 근로자라는 양적인 면과 노동조합의 결성에 있어서 근로자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질적인 면 모두를 아우른다. 특히 자주성이란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임을 요하는 것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주적이라 함은 외부의 지배·간섭을 받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관리·운영되는 것을 말하며, 외부라 함은 사용자·국가·정치단체·종교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적극적 요건 중 목적상 요건이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극적 요건(결격요건)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및 그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⑶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의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구비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자체에서 설립신고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점에 비로소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대법원도 법문에 충실하게 만일 행정관청이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른바 적격노조, 법내노조, 법률노조)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⑷ 나아가 대법원은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는 등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지라도, 앞서 본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위 대법원 93도855 판결은 쟁점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노조가 당국에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전에 급히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던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의 수조차 불분명하여 실체가 확실하지 않았으며, 설립 이래 조합비의 징수, 총회의 개최, 단체교섭 등의 노조활동이 아예 없었던 사안이었다. 쟁점 노동조합은 심지어 가입 대상 근로자들이 우편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하여도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쟁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까지 막는 등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가입시도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근로자들에게 쟁점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선동·조정하였을지라도, 쟁점 노동조합은 애당초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3자개입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⑸ 이렇게 본다면, 위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의 사안에서도 피고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오로지 원고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하에 사용자인 유성기업이 피고 노조의 설립과정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이상, 피고 노조는 태생적으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 자주성을 원시적으로 흠결하여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⑹ 위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은 더 나아가 어느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흠결함으로써 설립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어느 정도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시로 들고 있다.
라. 피고 노조가 나중에 주체성 및 자주성을 갖춤으로써 설립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회사설립무효의 소의 경우에는 상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의 보완까지 인정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설립될 당시 무효인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나중에 이러한 하자가 보완됨에 따라 회사의 설립을 무효로 보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그 설립무효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상법 제189조에 따라 재량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애당초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이는 대법원이 상법 제189조에 따라 재량기각을 하기 위한 요건 내지 그 허용되는 범위를 한층 완화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상법상 회사설립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긍정함으로써, 개별 사안마다 법원이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원고에게 피고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⑴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소’로 허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가 과연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를 추가로 살피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형태의 소가 민사소송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확인의 소가 적법해지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⑵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는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 만일 피고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서게 되면 원고 노조는 사용자인 유성기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 노조가 적법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거의 법률관계 역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효력 유무가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으므로, 피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놓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 위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의 판시 요지
⑴ 위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은 지금까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노동조합 설립무효확인의 소 내지 노동조합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가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민사상 ‘확인의 소’로서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위와 같은 형태의 민사소송이 허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규정이었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을 더는 적용할 수 없게 된 법적 공백이 어느 정도 보충될 것이다.
⑵ 나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내지는 그 법적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⑶ 위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은 본안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주체성, 자주성 등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만약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형식적 요건이 이미 구비되었을지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그 설립이 무효이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였다.
⑷ 나아가 위 판결이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이러한 하자가 보완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심리·판단하는 법원뿐 아니라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상세한 지침을 남겼다.
6. 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671-682 참조]
가. 확인의 대상
⑴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종손이라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 별도로 보존등기된 2개의 건물이 동일건물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 등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⑵ 다만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이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이지만, 그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⑶ 한편 확인의 소로써 위험 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잡은 구체적 권리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⑷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은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에 관한 판단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⑸ 일반적으로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의 주지는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주지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⑹ 마찬가지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나.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의 상대방
⑴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예컨대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0949 판결).
⑵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⑶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마찬가지로 소제기 전에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음을 들어 청구한 경우라면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확인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⑷ 또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⑸ 예컨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 판결).
⑹ 또한 가장 임차인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 지급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후순위 진정 채권자로서는 곧바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그가 부당이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이므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⑺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⑻ 원․피고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타인 간의 권리관계라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예컨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들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사해판결이 선고․확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0719 판결).
⑼ 또한 토지를 수용하는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한 경우,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⑽ 반면 구 도시재개발법(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852호 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 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반드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①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③ 예컨대,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는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확인의 이익이 긍정된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17 판결 참조).
④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⑤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⑥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갑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비록 징계처분에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⑵ 대학의 교수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
①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을 당한 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면 교수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되고,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을 당한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②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무효인 채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무효인 직위해제․면직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채용계약 해지 또는 직위해제․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채용계약 해지나 직위해제․면직처분으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침해된 급료 지급이나 명예 회복은 이행청구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③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 53조의 2 4항 내지 8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그 거부 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라.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확인청구
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⑵ 부동산등기법 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유권 확인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⑶ 그러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20519 판결).
⑷ 문제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위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⑸ 한편,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데다가 당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다면,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⑹ 또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 등기법 65조 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마. 확인의 소의 보충성 및 수단의 유효적절성
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 비추어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⑵ 다만 목적물이 압류된 경우나 또는 현재 손해액수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1298 판결 참조)에는 청구권 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⑶ 한편, 소극적 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판례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 등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등의 권리자를 상대로 그 권리 귀속에 관한 적극적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소유권 등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분쟁의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860 판결).
⑷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⑸ 또한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⑹ 그렇지만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
⑺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⑻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개인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도 마찬가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⑽ 토지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토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행사 제약이나 그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권리행사상 제약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소의 이익
⑴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된다(민소 250조).
이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⑵ 따라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⑶ 또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조합의 일정한 시기의 운영재산상태를 밝힌 장부이거나 그 조합의 운영재산의 손익관계를 밝힌 보고문서로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⑷ 또한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