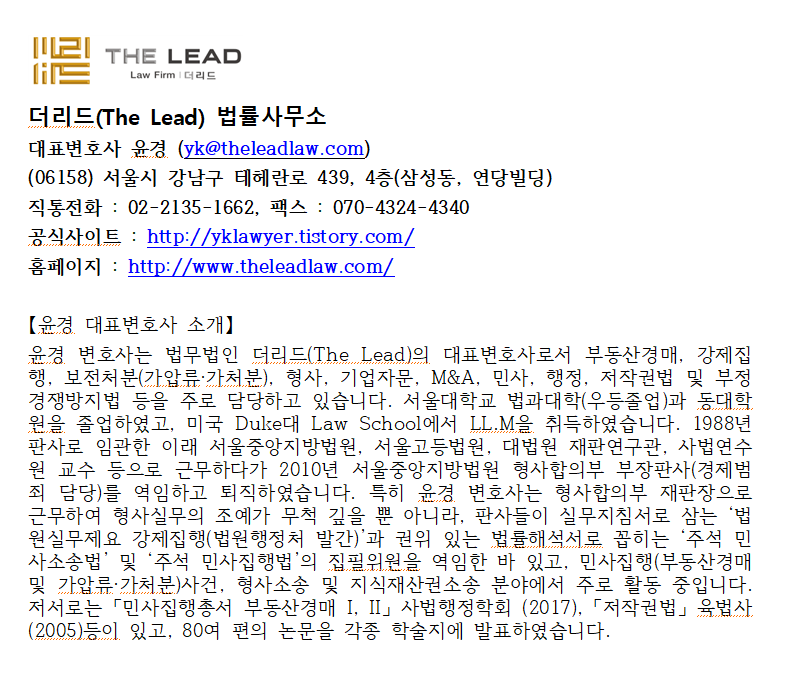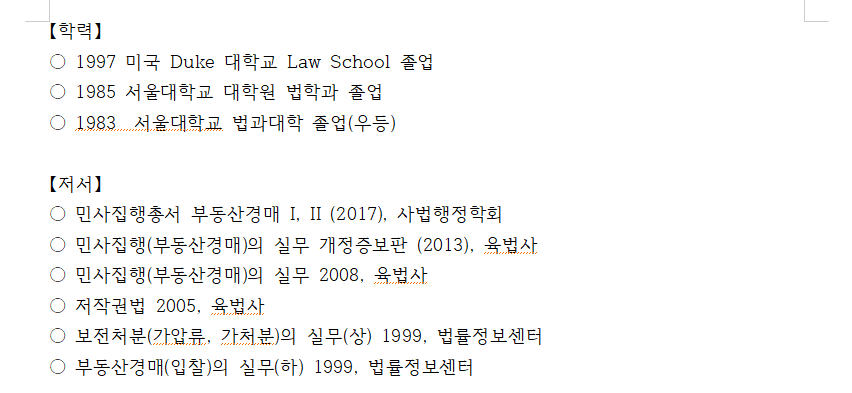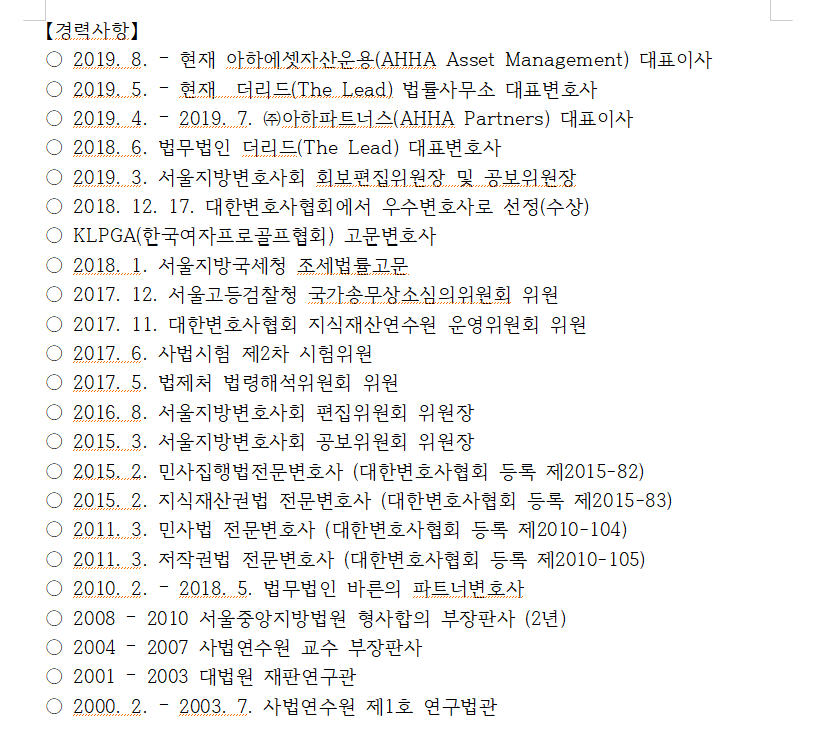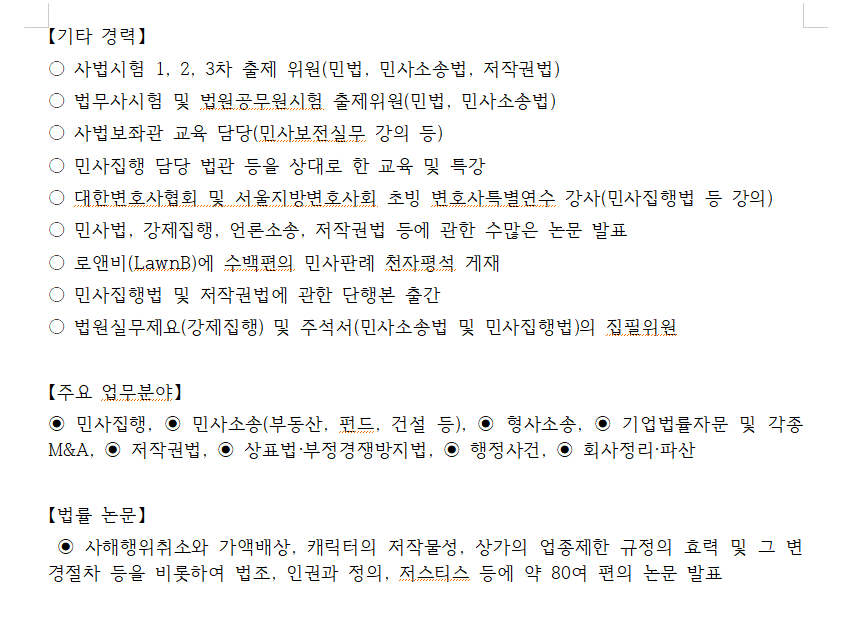【판례<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합의해제ㆍ해지 당시) /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합의해제ㆍ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ㆍ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ㆍ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ㆍ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1-88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외 1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자금을 조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1은 분양업무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40평을 6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와 별도로 원고, 소외 2, 소외 3(‘원고 등’)은 2011. 8. 8. 소외 1의 주도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들의 상가 신축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1. 10. 31. 다시 2억 원을 피고들에 지급하였다.
⑶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은 2011. 11.경 원고 등과 피고들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그 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원고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⑸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별다른 근거 없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ㆍ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②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합의해제 당시) 및 원칙적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⑵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⑶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⑷ 원심이 합의해제를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인정되고,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기존의 위약금 약정을 합의해제시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합의해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33-936 참조]
가. 합의해제의 의의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나. 합의해제의 성립
⑴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⑵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었는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의 문제인데, ① 기존의 계약에 따라 이미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② 한편 손해배상의 합의는 합의해제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의견이 엇갈린다면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 합의해제의 효력
⑴ 당사자 사이의 효력
㈎ 계약의 소급적 소멸 : 물권변동도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 해방효 및 원상회복
①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합의해제 약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해제 자체를 다시 해제할 수는 없다. 기존의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됨으로써 합의해제의 효과는 완결되는 것이고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의무
⑴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⑵ 제3자에 대한 효력
① 합의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합의해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정해제의 경우 보호되는 제3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관을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채권가압류(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도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6. 1. 98다17930 판결).
③ 채권양도 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해제 :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의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채권의 양수인은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관’을 신뢰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그 기초가 되는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등)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합의해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었다고 하여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앞서 본 가압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44-747 참조]
가.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 제1항). 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제452조 제2항). 이러한 규정 및 아래의 법리는 반대로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 합의해지를 통지하였는데 아직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질권설정계약이 아직 합의해지되지 않았는데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버린 사안)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349조 제1항), 그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승낙, 통지의 효과와 관련한 민법 제45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49조 제2항),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52조 제1항 역시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해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그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었다면 그 해지 사실은 추정되고, 그렇다면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 또한 추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그 선의를 다투는 질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통지를 철회하기 전에도,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불성립·무효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에는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452조 제2항은 대항요건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기 전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⑵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미 이행한 경우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이와 별도로, 채권양도의 무효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제108조 제2항 등)에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즉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인 채무자는 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불성립/무효를 모르고 양수인에게 이행하였다면, 이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었다면 채무자의 선의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그 선의를 다투는 양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나.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⑴ 적용규정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재양도’로 취급하여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점에서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452조에 의하여 선의의 채무자만 보호된다고 할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최근의 판례는 “민법 제452조는 ‥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제452조 유추적용설을 택하였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⑵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① 양수인이 해제 등의 통지를 하기 전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소급적 무효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통설은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성립·무효인 경우와 달리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채권양도의 취소·해제·합의해제를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새로운 채권의 양도로 본 것이다. 이 경우 양수인이 새로 양도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해제 등의 통지권자는 양수인이 된다(과거 일부 판례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바 있지만,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통지권자가 양수인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은 다시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두 가지 방법 모두 허용하고 있다).
② 판례도 채무자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하고 채무자는 양수인의 의사에 터 잡은 적법한 해제 등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25 판결(양도인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양도를 해제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 사안),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76다2325 판결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
양수인의 의사에 터 잡은 해제 등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만약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누구에게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양수인에 의한 해제 등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양도인도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⑶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이미 이행한 경우
① 1설(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② 2설(제450조의 대항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설에 따르면,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리자이지만, 제45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취소·해제·합의해제(또는 그 사유)를 모르고 양수인에게 이행하였다면, 이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최근의 판례도 해제 등의 통지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갖게 된 사안에서, “민법 제452조는 ‥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이 견해를 따랐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5. 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1-882 참조]
가. 합의해제의 법적 성격(= 계약)
⑴ 합의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인 점,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⑵ 합의해제는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의 청약과 승낙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이 불일치해도 합의해제는 불성립한다.
간혹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각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피고 사이에 계약이 합의해제 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쌍방이 모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여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⑶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종전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물권변동에는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소유권이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⑷ 합의해제가 된 경우의 원상회복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받은 날로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여부
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없이 해제의 합의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⑵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⑶ 합의해제가 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민법상 해제의 일반적인 효과가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한다.
6.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1-882 참조]
⑴ 원심은 합의해제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특약이나 이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다른 근거 없이 인정한 잘못이 있어 파기되었다.
⑵ 파기환송의 취지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보라는 것이다.
단,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1. 8.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지급 이후 2011. 10. 31. 중도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1. 11.경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바,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연체가 거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을 유보하여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