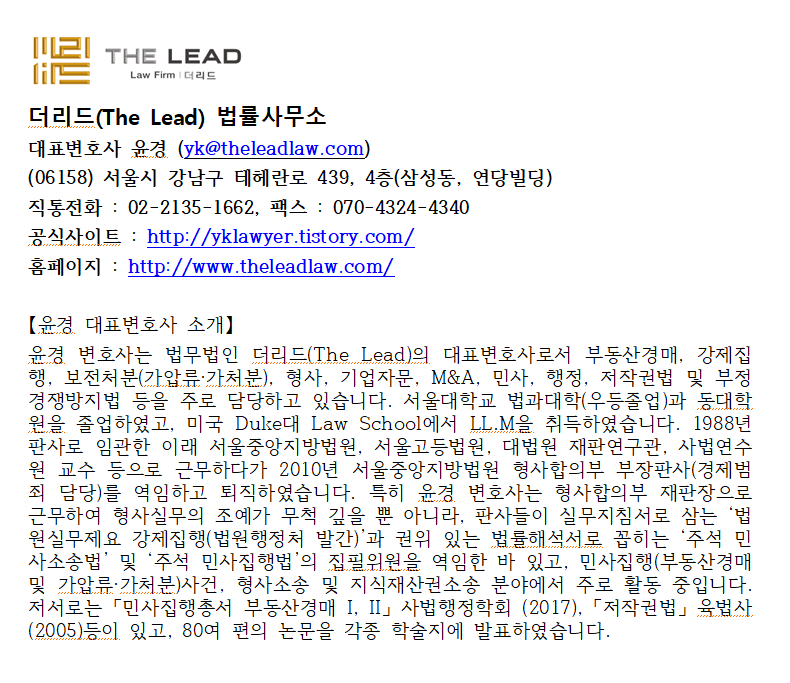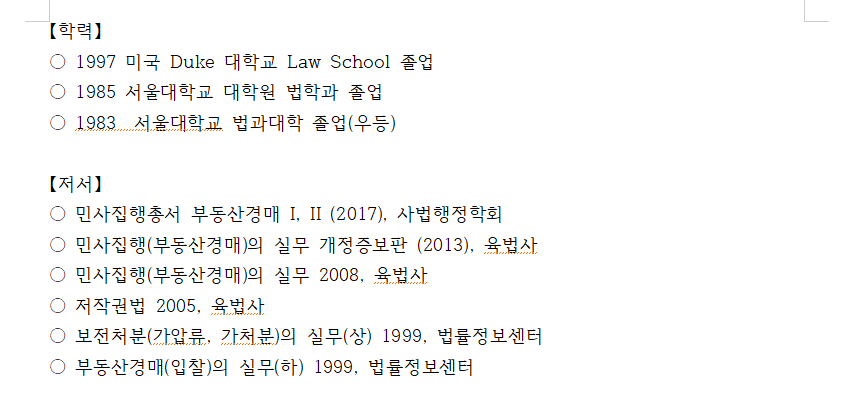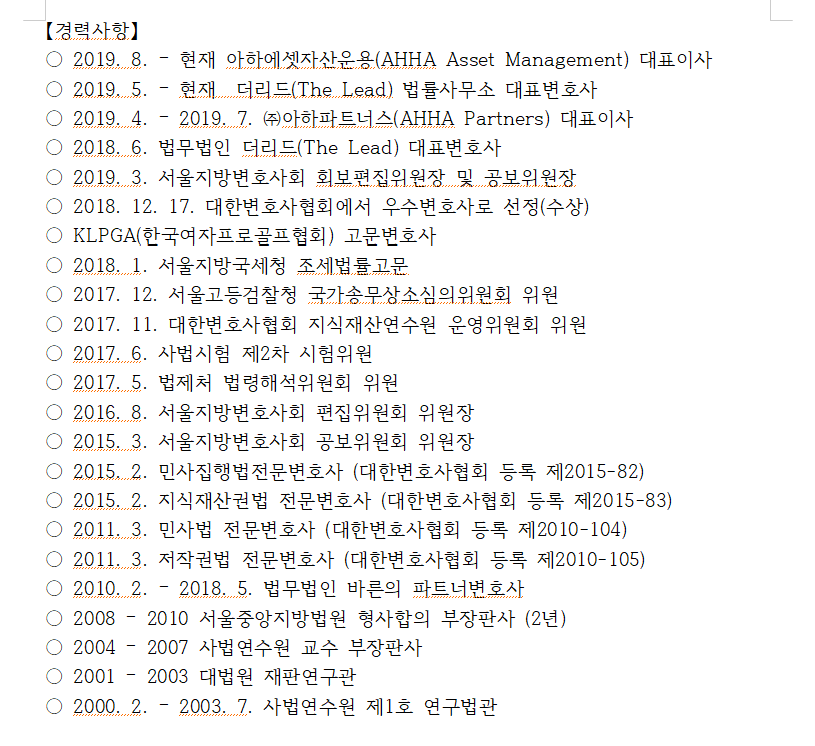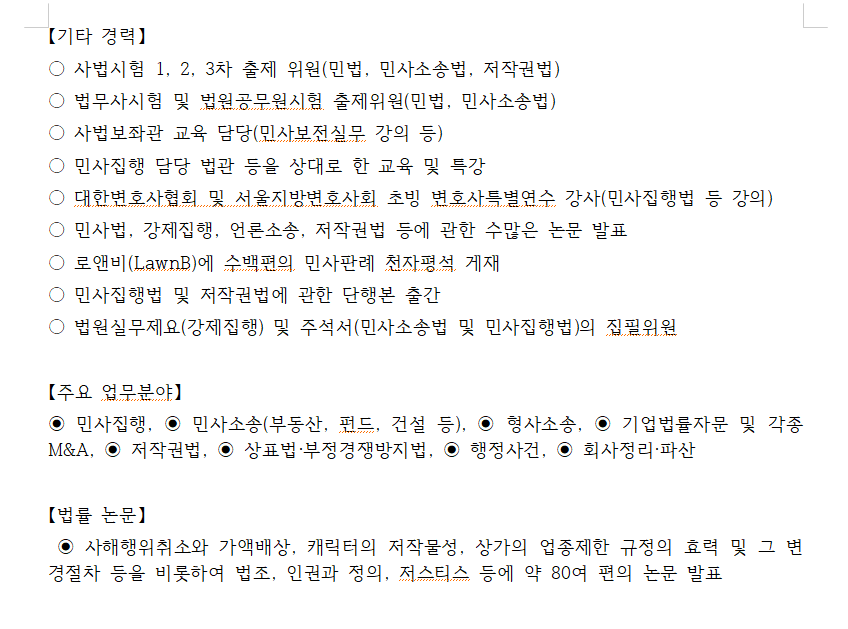【판례<유치권과 간접점유,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점유의 상실(제328조)과 유치권의 소멸,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소멸여부>】《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4-11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참가인은 2012. 7. 11. 피고 31에게 이 사건 부동산 104호를 임대하였고, 피고 31은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
⑵ 참가인은 피고 31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한편, 피고 3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104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⑶ 법원은 2014. 12. 4. 무변론으로 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 31은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104호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나. 쟁점 :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소멸 여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⑶ 대법원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한 사건에서, 피고와 유치권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유치권자의 점유
가. 점유의 의미
⑴ 유치권자의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도 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하고(민법 328), 다만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불법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민법 204·192)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뒤에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는 물론, 물건의 점유를 일시 상실하였다가 다시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을 취득한다.
공사수급인은 공사완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일 뿐 그 도급계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52713 판결).
⑵ 간접점유 포함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나(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⑶ 배제사유로서의 불법점유
㈎ 불법점유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민법 320②).
점유의 불법개시란 점유가 적극적으로 가해진 불법행위 즉, 사기, 강박, 침탈 등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 없이 그 권원 없음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개시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무권원에 대하여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60 판결).
㈏ 원시적 불법점유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점유 취득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점유취득이 된다(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44 판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482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42 판결).
㈐ 사후적 불법점유
점유개시 시기에는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권원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던 중 채권을 취득한 경우(예를 들어 보증금 없는 월세 건물임대차계약에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은 무권원점유가 되는데, 이후 임차인이 건물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 채권자의 점유가 본조에서 말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점유개시 시기에는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었으나 피담보채권의 발생 전에 점유권원을 상실하였고 점유자가 이를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점유에 해당한다.
민법 320조 2항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민법 750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와 동일하므로, 점유개시 시기에는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발생 전에 점유권원을 상실하였다면 그 점유는 권한 없는 위법한 점유가 되며,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안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판례 중에는 ① 악의 또는 선의,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본 듯한 판결(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과 ②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본 듯한 판결(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이 있다].
판례도 점유자가 비용지출 당시에 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유치권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⑷ 유치권의 범위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터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그러나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라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⑸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91⑤).
매수인은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유치물을 수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이다.
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⑴ 점유
①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예컨대, 공장 신축공사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②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대법원 2002. 11. 27. 자 2002마3516 결정 등).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또한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7. 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대법원 2017. 2. 8.자 2015마2025 결정 등 참조).
한편,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③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등 참조).
⑵ 점유의 적법성
①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320조 제2항). 법문은 점유를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권원이 소멸하여 ‘사후적으로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② 점유가 불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실’만 있어도 충분한지에 관하여, 통설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아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판결).
③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 점유의 상실(제328조)과 유치권의 소멸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2조 제2항). 판례도 피고의 점유침탈로 원고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원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원고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③ 그리고 유치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일시 상실하였다가 후에 다시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새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2조 제2항). 판례도 피고의 점유침탈로 원고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원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원고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③ 그리고 유치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일시 상실하였다가 후에 다시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새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4. 간접점유
가. 의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제194조).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행사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고,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된다. 그런데, 간접점유도 점유의 일종이므로, 사회통념상으로 사실상의 지배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유이다.
이처럼 간접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설은(심지어, 간접점유도 사실상의 지배에 따른 점유라고 하는 다수설의 주장자 조차도) 간접점유의 성립에는 법률관계인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며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또한,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어서도,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 민법 제206조∼제209조)을 가지지 않는다.
나.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⑴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존재할 것 (= 특정인의 직접점유는 타주점유일 것)
이 특정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소유의사 없이 하는 점유)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동산의 경우)나 이전등기(부동산의 경우) 전에는 아직 매수인에게 소유의사가 없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간접점유를 취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산 A의 소유자인 갑이 을과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하고 갑이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접점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제는 을에게 소유의사가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을은 간접점유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점유개정), 그 동산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다.
⑵ 사실상의 반환청구력이 존재할 것
갑이 어떤 동산을 직접점유하지 않고 을이 직접점유하지만, 을에게는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갑의 소유인 A동산을 을이 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임차기간만료 후에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갑에게는 그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반환청구력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주의할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바로 사실상의 반환청구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의 반환청구력은 간접점유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사실상의 반환청구력의 침해는 간접점유 나아가 간접점유권의 침해로 된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⑶ 점유매개관계의 존재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점유매개관계란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일시적인 법률관계이므로, 반드시 반환청구관계가 존재한다.
점유매개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예컨대,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근로계약·위임계약·도급계약·운송계약·창고계약·위탁매매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예컨대, 유치권자와 유치물소유자와의 관계(민법 제949조), 친권자와 미성년자와의 관계(민법 제916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민법 제360조), 유언집행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민법 제110조· 제1103조).
간접점유의 성립에는 점유매개관계의 존재가 필히 요구된다. 다만, 이 점유매개관계는 사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의 기초인 법률행위가 반드시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간접점유자의 지위
⑴ 내부관계(직접점유자와의 관계)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7조)이나 자력구제권(민법 제209조)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에 따라서 점유하므로,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나 본권에 기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가진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그가 점유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를 방해하면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가진다.
⑵ 대외관계(간접점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모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침해된 경우 간접점유자도 제3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점유물반환청구의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3자에 대한 직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과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은 병존하므로, 각자가 독립하여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송계속의 효과나 기판력도 타방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공동소송인 경우에도 통상의 공동소송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일방의 청구가 만족되면 타방의 청구권도 소멸한다.
라. 간접점유의 상실
⑴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의 소멸이나 점유매개관계의 단절에 의하여 상실한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은 전세·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사실상의 단절을 의미한다.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임차인이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종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영구히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된다.
⑵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를 회수할 수 있으며(민법 제207조),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처음부터 점유를(따라서, 점유권도)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92조 제2항).
5. 점유매개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4-115 참조]
가. 위 판결의 판시 내용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판결의 취지
⑴ 유치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유치권자의 권리 보호).
⑵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이고, 피고는 권원으로 유치권자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만 계속했다.
즉, 원고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피고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점유권원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되어버렸다.
언뜻 보면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⑶ 그러나 유치권자 입장에서 보면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권자와 직접점유자를 한 그룹으로 보면, 점유권원이 보다 분명해진다.
즉 피고는 간접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자신의 점유권원으로 주장할 수 있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4-115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는 임차권을 내세워 항변하고 있다.
원심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 이상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⑵ 대상판결은 점유매개관계에 대하여만 판시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위 판결이 상세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다.
나. 대상판결의 경우에도 유치권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함
⑴ 사안의 특수성 (=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계약이 해지됨)
대상판결의 사안은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에 계약이 해지되어 직접점유자의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채권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사례와 차이가 있다.
⑵ 그러나 이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에 대한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당초 직접점유자가 점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간접점유자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간접점유자가 보호받아야 할 유치권자의 권원, 이익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물권적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두 점유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다.